덜컹 거리는 버스에서 눈을 떴다. 하늘을 내리쬐는 태양빛과, 열린 창문에서 새어들어오는 신성한 공기가 어색했다. 하늘엔 그 흔한 구름 한점 없었고, 밝은 태양빛이 환하게 내리쬐고 있는 아름다운 날이었다. 그러나, 화창한 날씨와 달리, 창문에 비친 내 표정은 썩 좋지 않았다. 오랜 세월 도시에서 살아온 내게 이런 평화로운 시골 풍경은 익숙치 않았다. 덜컹 거리는 시골 버스도, 바람을 타고 들어오는 역한 비료 냄새도, 멀리서 뛰어 다니는 양과 양치기 개도 내겐 모두 비일상에 가까운 풍경이었다. 도시의 삶이 상처만 남겼음에도, 난 아직도 그곳을 그리워 하고 있다니. 참 나란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족속이다. 그렇게 몸을 비틀면서 열신히 살아왔음에도, 그곳엔 배신과 쾌쾌한 먼지 쌓인 회색 공기 밖에 없는데도 그곳을 그리워 하다니. 멀리서 '짹짹' 갸냘픈 울음 소리를 내며 날아가는 새 두마리가 보였다. 저 둘은 부부일까? 새에 대해 배운 적이 없어 무슨 새인지도 몰랐지만, 저 새들이 평범한 사이가 아니라는 것 쯤은 알겠다. 왜냐면 나에게도 저런 시절이 있었으니까. 서로에게 영원을 맹세하고, 가족을 이루며, 머리가 새하얗게 될 때까지 서로만 바라보기로 맹세한 그녀가 내게도 있었다. 하아, 한이 맺힌 한숨이 새어나왔다. 새 삶을 사려고 도망쳐 왔음에도, 이전의 삶을 잊지 못하다니. [아아, 이번에 내리실 곳은 로랭스. 로랭스입니다.] 치지직, 낡은 스피커에서 기사의 목소리가 새어 나왔다. 온몸을 제복으로 가리고 있는 기사의 목소리는 의외로 젊은 여성의 목소리였다. 어쩐지, 키가 조금 작다고 생각 했는데 여성 기사였군. 그래도 시골은 시골인가, 젊은 여성 기사가 운전하는 버스여도 카메라가 없는 시골길을 달리는 버스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오히려, 언제 죽어도 상관 없을 노인들만 탄다고 생각하는 건지 도시라면 상상도 못할 속도로 달려서 나는 창문을 낑낑 거리며 닫았다. [삑-!] 창문 옆에 빨간 버튼을 누르자, 다시 한번 스피커가 요란한 소리를 냈다. 기사는 두꺼운 모자를 눌러쓴 채 내쪽을 한번 돌아보더니 정면에 보이는 정류장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리고 드디어 버스의 속력이 점차 줄어들었다. 언제까지고 달려가다 날 죽음으로 안내할 것 같던 버스는 거의 떨어지려고 하는 간판이 반겨주는 로랭스 정류장에서 거대한 몸체를 멈춰섰다. 치익, 매쾌한 매연을 뿜으며 색이 바랜 노란 버스가 완전히 멈춰섰다. 언제 퍼져도 모를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에게 고개를 꾸벅 숙이고 내려서자 붉은 벽돌로 지어진 조그마한 정류장이 눈에 들어왔다. [로랭스.] 로랭스. 옛날에 할머니께서 사셨던 농장이 있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다. 옛날에 왔을 때도 퍽 오래된 마을이라 촌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세월이 더 흘러서 그런지 오래된 정류장은 거미줄과 쌓인 먼지 때문에 귀신이 나온다고 해도 믿을 것 같았다. "하아,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었나." 나는 한숨을 푹 내쉬고 먼지 쌓인 정류장에 걸터 앉았다. 비싼 돈 주고 산 청바지가 먼지에 묻어 더러워졌다. 이전에 나였다면 세금을 어디다 쓰는 거냐고 불 같이 화냈겠지만, 곧 이곳에 일부가 될테니 적응해야 겠지. 예전에 알던 분이 여기로 마중나올 사람을 보낼 거라 했으니, 기다려보기로 했다. 그런데 약속 시간에 거의 맞춰서 도착했는데도 미리 나와서 기다려 주지 않다니.... 이곳 사람들은 예전부터 느꼈지만 지나치게 여유로운 경향이 있다. 그렇게 약속 시간이 지나고, 30분, 1시간, 1시간 반이 지나자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벌써 이 거미와 먼지만 있는 정류장에서 기다린지 2시간 가까이 됐다. 이 정도면 충분히 기다렸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기본적인 시간 약속 조차 지키지 못하다니.... 이 거지 같은 곳에서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기억을 더듬 거려도 길 같은 건 하나도 모르지만, 어쨌든 표지판 같은 거라도 보면서 가면 마을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다. 그렇게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찰나에 멀리서 누군가 달려오는 게 눈에 들어왔다. "어이! 미안, 많이 기다렸지!" 밝고 높은 목소리. 잘 기억나지 않은 어릴 적에 한번 들어본 목소리였다. 어딜가나 나를 부르던 저 목소리는 잊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었다. 로랭스 마을 유일한 목장의 딸, 로이나 페리오가 내 앞에 섰다. 나보다 한살이 많은 그녀는 목장 딸 답게 탄탄한 몸과 조금 그을린 건강한 피부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향수라도 뿌린 건지, 살랑 거리는 주홍빛 머리카락이 바람에 흔들리면 은은한 향기가 바람을 타고 코를 간지럽혔다. 멀리서부터 달려 왔음에도, 그녀는 별로 지치지 않는 모습이었다. 그야말로 온몸이 그녀의 건강 상태가 완벽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평소에 운동과 담을 쌓고 살았던 내 생활이 떠올라 조금 찔렸다. 그래도 오랜만에 만나는 지인인데, 재회의 순간이 영 매끄럽디 않았다. 척 보니까 날 마중 나오기로 한 주민이 로이나 같은데 이렇게 약속 시간에 늦다니. 내가 기억하는 로이나는 항상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됐다. 오래 전 일이기도 하고, 이런 곳에 살다보면 시간 감각이 필연적으로 무뎌지겠지. 서로 무안해지지 않게 여기선 잘 넘어가야지. "오랜만입니다. 페리오 씨." "오.... 지금 나한테 페리오 씨라고 한거야? 하하하하!" 대체 뭐가 그리도 웃긴 건지, 로이나는 배에 손을 올리고 땅을 보며 미친듯이 웃기 시작했다. 아니 뭐, 어렸을 때 놀아주던 꼬맹이가 갑자기 불쑥 커서 와서는 존칭 붙여주면서 깍듯하게 있으면 나같아도 웃길 갓 같긴 하다. "하하하하하!" 근데 너무 과하게 읏는 거 아닌가. 저러다 허파에 구멍이라도 뚫리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로이나는 정신 없이 웃어댔다. 그리고 몇분이 지나서야 찔끔 흘린 눈물을 손가락으로 닦으며 웃는 걸 멈췄다. 내 어릴적 기억에도 에너지가 넘치다 못해 흘러 넘치던 인간이라 피해다녔던 걸로 기억 했는데, 그 넘치는 에너지가 성인이 돼서도 저렇게 남아 있는 걸 보니 내 추억 속 모습의 로이나가 겹쳐 보였다. 항상 한손에 나뭇가지를, 그리고 다른 한손으로 내 손을 붙잡고 산이나 바다를 향해 달려가던 그녀의 모습이 아른 거렸다. 진짜 사람이 키만 커졌지, 이렇게 어릴 때 모습과 같을 수가 있을 까. 단언컨데 나는 과거의 모습과 98% 이상 일치하는 어른을 오늘 처음 봤다. "하하, 존. 넌 진짜 어렸을 때랑 바뀐게 하나도 없구나! 그 재미없던 성격까지 그때랑 똑같아!" "페리오 씨야 말로 옛날이랑 변한게 없으시네요." "무슨 소리! 나도 이제 우리 목장을 운영하는 공동 목장주 인걸! 그리고 앞으론 딱딱하게 페리오 씨라고 부르지 말고. 예전처럼 로이나라고 편하게 불러줘!" "예...." 진짜 같이 있으니 영혼이 빨리는 것 같았다. 저 넘치는 에너지를 목장일에 쓰고도 저렇게 남아돈다니. 전 직장의 생산 라인에 보냈으면 에이스는 따놓은 거나 다름 없었겠는데. 일단, 빨리 마을에 가는 게 먼저다. 정류장에서 마을까지 가는데 내 기억으로 거의 40분 가까이 걸렸으니, 지금 출발하지 않으면 해가 거의 질때 쯤에 마을에 도착할 거다. "그보다, 오랜만에 고향에 온 감상은 어때?" "로랭스는 제 고향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에이, 마음의 고향이란 말이 있잖아! 내 기억 상 적어도 방학 때 마다 여기 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부모님이 억지로 가라고 해서 온 거였죠." 그랬지, 생각해보면 부모님은 방학만 되면 날 케어하기 보단 할머니 농장으로 보내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일에 미쳐사는 우리 부모님 성격상 일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날 여기로 보낸 거였지. 얼마 전에 일을 그만두고 여기로 내려온다고 했을 때도 날 실패자처럼 보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던 인간들이다. 이제와서 내가 뭘 하든 신경 쓰지 않겠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 처럼. 어쨌든, 그런 부모여도 여길 가끔 내려가게 해줬으니 내가 다시 여기로 올 기회를 만들어 줬으니 뭔가 기분이 이상했다. 바쁜 삶에 염증을 느낀 내가 가장 먼저 생각난 곳이 이곳이었으니, 로이나의 말대로 이곳은 내 마음의 고향이라고 불리기 충분한 곳일지도 모르지. "오, 얘기 하다보니 거의 다 왔다!" 저 멀리, 로랭스 마을이 보이자, 로이나는 손가락으로 마을을 가리켰다. 그야 말로 책에나 나올법한 아기자기한 시골 마을의 전경이 눈에 들어왔다. 우인 하나도 변한 것 없는 시골 마을의 입구에 도달했다. 마을 간판엔 '로랭스에 오신 걸 환영랍니다!' 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로랭스에 도착한 후, 로이나는 몸을 빙글 돌려 내 쪽을 돌아봤다. 그리고 양팔을 활짝 벌리고 태양과도 같은 미소를 지었다. "로랭스에 돌아온 걸 환영해!"
댓글
총 12 개눈싸움
22분 전 붕붕붕붕붕붕붕붕붕옵붕이
붕붕붕붕붕붕붕붕붕옵붕이
오늘 웹툰 왜이래
33분 전 마법사가되어버린ww
마법사가되어버린ww
마비노기 모바일 재밋네[1]
33분 전 Hyan
Hyan
이게모지?
51분 전 붕붕붕붕붕붕붕붕붕옵붕이
붕붕붕붕붕붕붕붕붕옵붕이
옵붕이들 보면 그거생각남
55분 전 녜힁_
녜힁_
트릭컬하고싶은데[4]
1시간 전 녜힁_
녜힁_
나 옵붕
1시간 전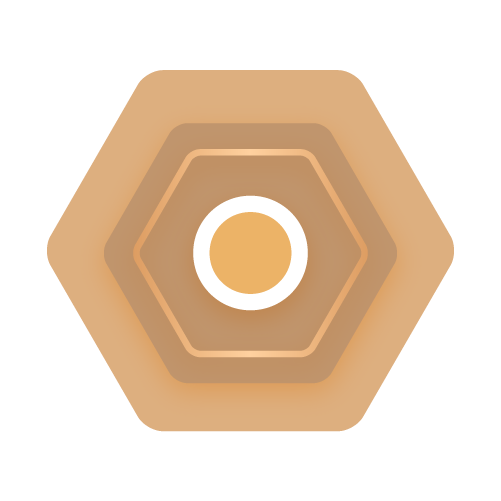 우당탕탕옵붕이의잭스여정
우당탕탕옵붕이의잭스여정
이제 [1]
[1]
1시간 전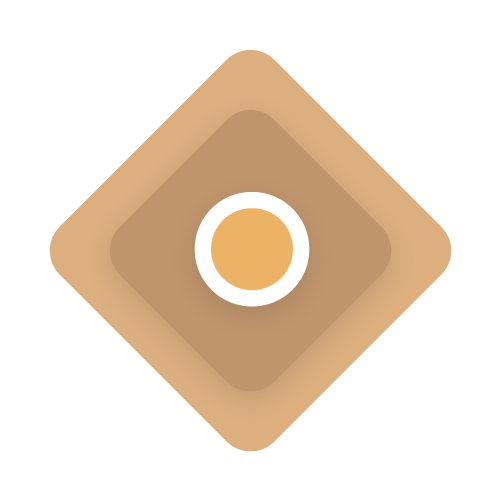 집착멘헤라얀데레쇼타왕자
집착멘헤라얀데레쇼타왕자
내꿈은러시안블루[2]
1시간 전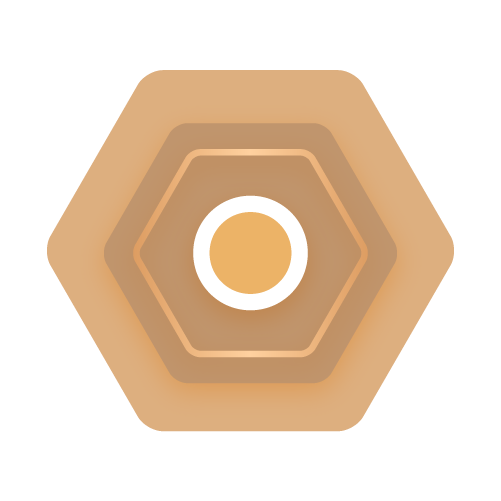 Etale
Etale
요즘 나 진짜 게으름
1시간 전 KDRD
KDRD
중간 ㅈ됌 [6]
[6]
1시간 전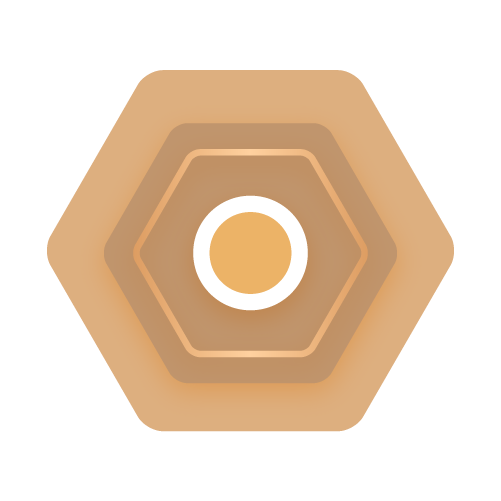 우당탕탕옵붕이의잭스여정
우당탕탕옵붕이의잭스여정
지듣노 [1]
[1]
1시간 전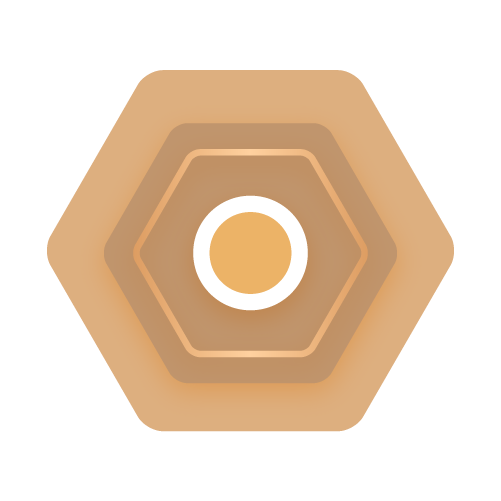 우당탕탕옵붕이의잭스여정
우당탕탕옵붕이의잭스여정
옵부이 첫인상[10]
1시간 전 Hyan
Hyan
신병3 보고왔다 [5]
[5]
1시간 전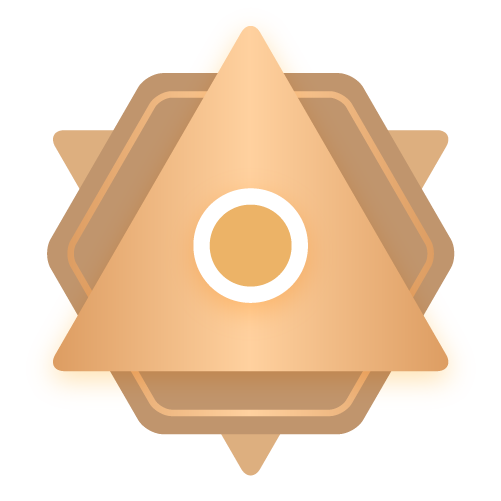 세계최강귀요미럭스
세계최강귀요미럭스
아니잇!!!!
1시간 전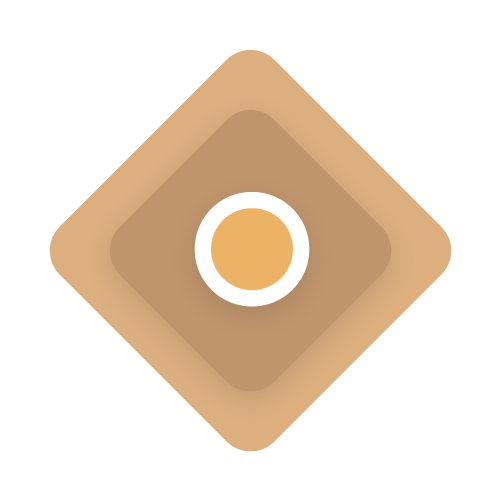 집착멘헤라얀데레쇼타왕자
집착멘헤라얀데레쇼타왕자
솔직히 말하께요
1시간 전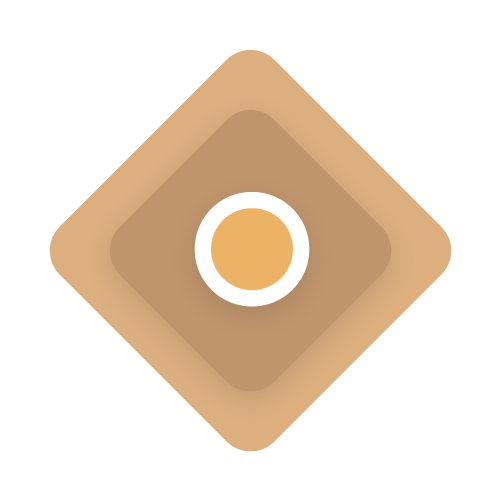 집착멘헤라얀데레쇼타왕자
집착멘헤라얀데레쇼타왕자
듀 [7]
[7]
1시간 전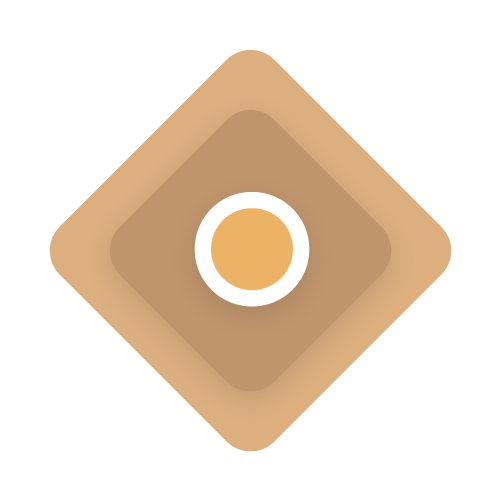 집착멘헤라얀데레쇼타왕자
집착멘헤라얀데레쇼타왕자
1 명 보는 중







크아악 더줘
느낌 괜찮아?
1. 덜컹 거리는 시골 버스도< 두번을 강조할 의미가없는거같음. 첫 구절에서 이미 독자에게 설명을해, 중복되는말은 피로를느끼게함. 2."온몸을 제복으로 가리고 있는 기사의" 라는 문단에서 기사가 버스기사인지 전투하는 기사인지 모르겠음. "온몸을 제복으로 가리고 있는 버스기사의"라고 하면 이해가 한번에 될듯? 3."정류장에서 마을까지 가는데 내 기억으로 거의 40분 가까이 걸렸으니, 지금 출발하지 않으면 해가 거의 질때 쯤에 마을에 도착할 거다." 문장부터 "오, 얘기 하다보니 거의 다 왔다!" 이 전 문장에서 시간의 흐름이 이상함. 많이 얘기를한 것도 아닌데 벌써 도착한것이 자연스럽지않음. 시간의흐름처럼 몇번의 대화를 더 하던가, "로이나와 ~~대화를하다보니 시간이 금방갔다" 이런 추가설명이 있으면 좋겠음.
오 확실히 그렇게 말해주고 보니깐 좀 어색한 부분이 많은 것 같네. 지적 고마워!
sdww근데 글이라는게 글쓴이의 감정이나 정신상태를 많이 담아내기도 하고 의도된 바 없이 무작위로 쓰이는건 안좋지만 버스기사의 까지 직접적인 표현 없이 그냥 기사의 써도 괜찮을거 같아 읽는 사람의 피로를 덜하게 하는것보다 사실 책 읽는 사람중에 어려운글 해석하는거 좋아하는 사람이 많거든 설명이 부실할수록 화면전환이 잦을 수록 읽기 불편하고 어지럽지만 더 상상가서 좋아하는 사람도 이써
무시무시한_모데카이저351076884글쓴이의 목적이 "버스"라는 목적인데 그걸 표현함에있어 전달이 안되면 그건 분명 잘못된 표현이지. 너가 말하는건 상상으로 더 좋아하는 표현이라면 글쓴이가 "버스"라는 목적성이아니라 '상상함에따라 다름'이 글에 비춰져야겠지. '그날 그사람은 그에게 당했다'보다 '4월8일 버스기사가 손님에게 당했다' 가 더 명확해 지는것처럼, 손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머지 정보로인해 더 몰입할수있는 도구가 되겟지?
직업이 소서리스야 ? 잘쓰네
오 각잡고 써보려는 건 처음인데 칭찬 고마워!